Muṣitasmṛtitā (Sanskrit; Tibetan phonetic: jengé) is a Buddhist term that is translated as "forgetfulness". In the Mahayana tradition, muṣitasmṛtitā is defined as forgetting or losing our focus on a virtuous object and instead focusing on an object or situation that causes non-virtuous thoughts or emotions to arise. Muṣitasmṛtitā is identified as:
* One of the twenty secondary unwholesome factors within the Mahayana Abhidharma teachings
| Attributes | Values |
|---|
| rdf:type
| |
| rdfs:label
| - 실념 (ko)
- Muṣitasmṛtitā (en)
|
| rdfs:comment
| - Muṣitasmṛtitā (Sanskrit; Tibetan phonetic: jengé) is a Buddhist term that is translated as "forgetfulness". In the Mahayana tradition, muṣitasmṛtitā is defined as forgetting or losing our focus on a virtuous object and instead focusing on an object or situation that causes non-virtuous thoughts or emotions to arise. Muṣitasmṛtitā is identified as:
* One of the twenty secondary unwholesome factors within the Mahayana Abhidharma teachings (en)
- 실념(失念, 염오념, 그릇된 염, 오염된 염,산스크리트어: muṣitasmṛtitā,영어: forgetfulness) 또는 망념(忘念)은 다음의 분류,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.
* 고타마 붓다가 설한 37도품(三十七道品) 중 8정도(八正道) 가운데 정념(正念)의 반대이다.
*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에서는 그대로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데, 이는 설일체유부에서는 심소법(心所法: 46가지) 중 대지법(大地法: 10가지) 가운데 하나인 염(念)의 그릇된 상태인 염오념(染污念)이 곧 실념(失念) 즉 그릇된 염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.
*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소법(心所法: 51가지)의 수번뇌심소(隨煩惱心所: 20가지) 중 대수번뇌심소(大隨煩惱心所: 8가지) 가운데 하나이다. 실념(失念)은 망념(忘念)이라도 하며,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.
* 생각에서 없어져 사라지거나 잊음
* 깜박 잊음
* 망각(忘却)
* <불교> 정념(正念)을 잃음 실념(失念) 또는 망념(忘念)은 염오념(染污念)을 말한다. 즉 오염된 염(念), 다시 말해, 번뇌에 물들어 흐려진 상태의 염(念)을 말한다. (ko)
|
| dcterms:subject
| |
| Wikipage page ID
| |
| Wikipage revision ID
| |
| Link from a Wikipage to another Wikipage
| |
| Link from a Wikipage to an external page
| |
| sameAs
| |
| zh
| |
| dbp:wikiPageUsesTemplate
| |
| en
| |
| fontsize
| |
| ko
| |
| title
| |
| has abstract
| - Muṣitasmṛtitā (Sanskrit; Tibetan phonetic: jengé) is a Buddhist term that is translated as "forgetfulness". In the Mahayana tradition, muṣitasmṛtitā is defined as forgetting or losing our focus on a virtuous object and instead focusing on an object or situation that causes non-virtuous thoughts or emotions to arise. Muṣitasmṛtitā is identified as:
* One of the twenty secondary unwholesome factors within the Mahayana Abhidharma teachings (en)
- 실념(失念, 염오념, 그릇된 염, 오염된 염,산스크리트어: muṣitasmṛtitā,영어: forgetfulness) 또는 망념(忘念)은 다음의 분류,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.
* 고타마 붓다가 설한 37도품(三十七道品) 중 8정도(八正道) 가운데 정념(正念)의 반대이다.
*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에서는 그대로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데, 이는 설일체유부에서는 심소법(心所法: 46가지) 중 대지법(大地法: 10가지) 가운데 하나인 염(念)의 그릇된 상태인 염오념(染污念)이 곧 실념(失念) 즉 그릇된 염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.
*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소법(心所法: 51가지)의 수번뇌심소(隨煩惱心所: 20가지) 중 대수번뇌심소(大隨煩惱心所: 8가지) 가운데 하나이다. 실념(失念)은 망념(忘念)이라도 하며,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.
* 생각에서 없어져 사라지거나 잊음
* 깜박 잊음
* 망각(忘却)
* <불교> 정념(正念)을 잃음 실념(失念) 또는 망념(忘念)은 염오념(染污念)을 말한다. 즉 오염된 염(念), 다시 말해, 번뇌에 물들어 흐려진 상태의 염(念)을 말한다.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실념(失念)은 염오념(染污念), 즉 번뇌에 오염된 염(念), 즉 번뇌에 물들어 흐려진 상태의 염(念)을 말한다. 염은 대지법에 속하며 대지법은 선 · 불선 · 무기의 마음(6식, 즉 심왕, 즉 심법)을 비롯한 모든 마음에서 항상 존재하는 마음작용들의 그룹이다. 따라서 실념은 모든 오염된 마음에서 항상 존재하는 마음작용들의 그룹인 대번뇌지법에 소속될 수 있으며, 실제로 《아비달마품류족론》 등에서는 대번뇌지법에 속한 법들로 불신(不信) · 해태(懈怠) · 실념(失念) · 심란(心亂) · 무명(無明) · 부정지(不正知) · 비리작의(非理作意) · 사승해(邪勝解) · 도거(掉擧) · 방일(放逸)의 10가지 마음작용을 들고 있다. 하지만, 실념의 본질은 대지법에 속한 마음작용인 염이므로, 엄격히 말하면 실념을 대번뇌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번뇌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《아비달마구사론》에서는 말하고 있다. 《품류족론》 제2권에 따르면,실념(失念)은 허념(虛念: 허망한 념) · 공념(空念: 헛된 념) · 망념(忘念: 기억하지 못함의 념) · 실념(失念: 정신을 잃음의 념) · 심외념성(心外念性: 마음의 외적인 념의 성질)을 말한다.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주요 논서인 《성유식론》에 따르면,실념(失念) 또는 망념(忘念)은 마음(8식, 즉 심왕, 즉 심법)으로 하여금 인식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본질적 성질[性]로 하는 마음작용이다. 그리고, 실념(失念) 또는 망념(忘念)의 마음작용은 이러한 본질적 성질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정념(正念: 바른 기억)의 마음작용과 상응하지 못하도록 장애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(散亂)의 마음작용과 상응하게 하는 발동근거[所依]가 되는 것을 그 본질적 작용[業]으로 한다. (ko)
|
| bo
| |
| bo-Latn
| - THL: jengé (en)
- Wylie: brjed ngas; (en)
|
| ko-Latn
| |
| sa
| |
| gold:hypernym
| |
| prov:wasDerivedFrom
| |
| page length (characters) of wiki page
| |
| foaf:isPrimaryTopicOf
| |
| is Link from a Wikipage to another Wikipage
of | |
| is Wikipage redirect
of | |
| is foaf:primaryTopic
of | |

![http://dbpedia.demo.openlinksw.com/c/5f8kkj19X8]()



![[RDF Data]](/fct/images/sw-rdf-blue.png)



![[RDF Data]](/fct/images/sw-rdf-blue.png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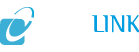
![[cxml]](/fct/images/cxml_doc.png)
![[csv]](/fct/images/csv_doc.png)
![[text]](/fct/images/ntriples_doc.png)
![[turtle]](/fct/images/n3turtle_doc.png)
![[ld+json]](/fct/images/jsonld_doc.png)
![[rdf+json]](/fct/images/json_doc.png)
![[rdf+xml]](/fct/images/xml_doc.png)
![[atom+xml]](/fct/images/atom_doc.png)
![[html]](/fct/images/html_doc.png)